추천도서
올해는 '말싸움', '글쓰기', '과학', '페미니즘'
#원문_대학내일_2016.03.04_https://univ20.com/31189
올해는 읽고 만다!
'한 달에 책 한 권 읽기' 실천해보자.
‘책 많이 읽기’는 단골 새해 목표다. 하지만 모든 계획이 그렇듯 실천하긴 어렵다. 미션 100% 완수가 어렵다면 계획이라도 알차게 짜보자. 평소 알고 싶었던 주제를 콘셉트로 정해 3월부터 한 달에 한 권씩, 10권을 읽으면 조금은 똑똑해진 상태로 연말을 맞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품고. 늦지 않았다. 우리에겐 아직 열 달이 남아있다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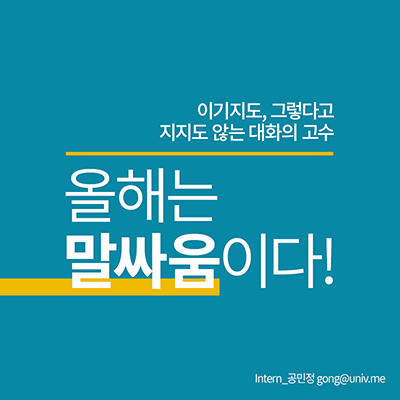
사주 아저씨가 생년월일을 뜯어보다 말했다. “말을 참 비수처럼 하네.” 팔자와는 달리 평생을 말싸움계의 하수로 살아왔다.
토론 수업에선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고, 남자친구의 억지에 꽁해도 그래그래 넘어가기 일쑤였다. ‘그때 그냥 이렇게 말할걸.’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유통기한이 지난 남의 넋두리에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.
사실 아저씨의 말이 맞기도 했다. 생각을 꾹 눌러 담다 뚜껑이 열리는 사람은 차가운 말 하나로 남을 찌르는 데 전문가가 된다. 이젠 그때그때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. 할 말을 제때 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대화의 고수일 것이다. 꼭 누구에게 이기거나 지지 않아도.


기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, 엄마는 좋고 싫고를 떠나 의아해했다. “기자는 글을 잘 써야 되는 거 아이가?” 그럴 법도 했다. 내 인생의 일기는 죄다 개학을 앞두고 몰아썼던 것들뿐이고, 꼭 200자 원고지에 써야 했던 독후감은 분량을 채우기에 급급했다.
늘 ‘다시 한 번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드립니다’로 끝났던 편지는 애교 많은 동생의 편지와 비교 당했다. “니는 엄마한테 할 말이 그리 없나?” 미안했다. 진짜 할 말이 없는 줄 알았으니까.
잡지사에서 서툴게나마 글을 쓰면서 깨닫고 있다.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뭔지 몰랐던 거라고. 글은 남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인 동시에, 내 생각이 뭔지 스스로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. 그래서 잘 쓰고 싶다. 엄마에게 하고픈 말을 정확하게 건네기 위해서라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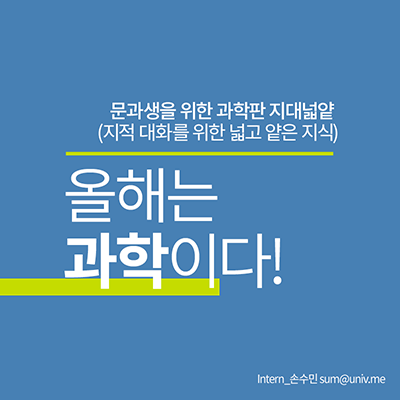
영화 <그래비티>를 봤을 때, 그야말로 황홀했다. 우주는 이렇게 아름답구나. <인터스텔라>를 보고는 본격적으로 입질이왔다. 내가 사는 곳은 3차원인데, 저기가 4차원이니까 저것이 저렇게 되고, 저건 저렇게 되고…. $&@*#* 이해 안 되는 게 꽤 많았다. <마션>을 보면서 깨달았다. 무식을 해결해야 영화를 즐길 수 있겠구나. 그래서 『코스모스』를 집어 들었다…가 일단 내려놓았다.
과학하고 가까워지는 데에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았다. 어떤 책부터 읽어야 막막함이 사라질까를 고민하다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뽑았다. 이름하여 문과생을 위한 과학 판 ‘지대넓얕’이다. 이정도면 그래도 과학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‘문송하지’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.


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때가 있다.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. 나보다 고작 2살 많았던 이 남자는 대화 내내 인생의 온갖 굴곡을 혼자 다 겪은 사람인양 떠들어 대는 것도 모자라서 “그쪽은 부디 착한 여자였으면 하네요”라는 찌질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.
계산대에서 내 식사 값을 계산하려는 나에게 “어머! 1단계 통과예요!”라며 김칫국을 항아리째 들이켜며 유유히 퇴장한 이 남자는 내 인생에서도 영원히 퇴장하게 됐다.
‘아… 그때 한 방 먹일걸!’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, 밀려오는 후회는 막을 도리가 없다.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착하기만 한 여자 말고, 똑똑한 한마디로 그런 놈들 입을 한 방에 다물게 만들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.







